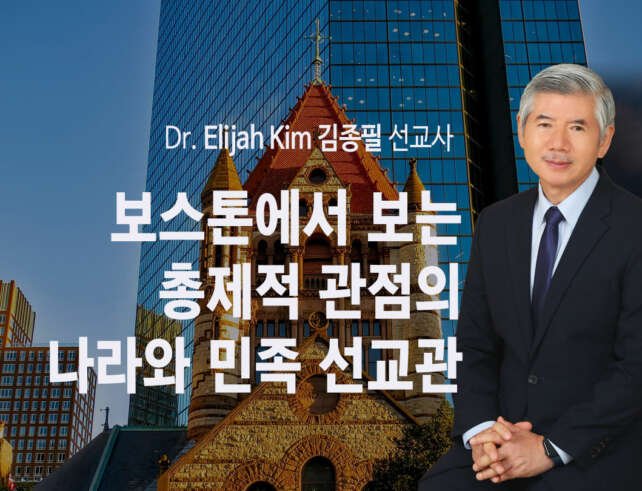당대 이전의 동방기독교(5~7C) (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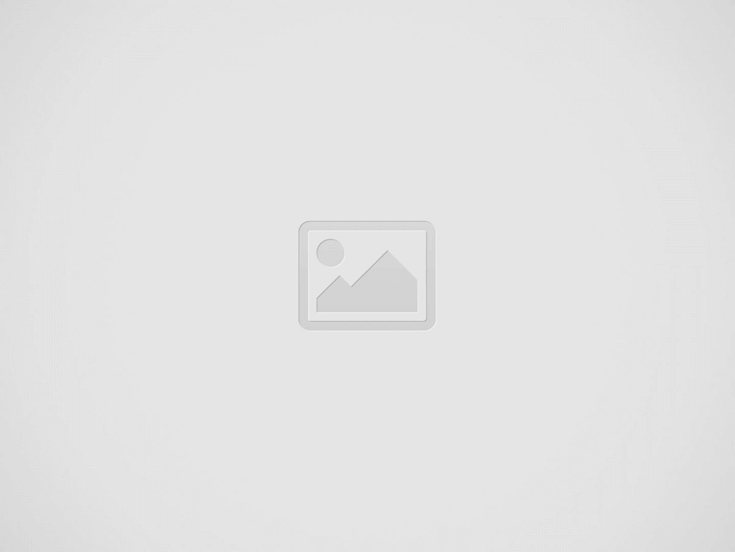

◙ Photo&Img©ucdigiN
7세기, 동방기독교 중국 변방 신장지역까지 진출
동방기독교의 행보에는 늘 순풍만 불어준 게 아니었다. 비록 그들이 초기에는 페르시아에서 관용적 대우를 받았지만, 후일 엄청난 박해와 순교도 감당해야 했다. 중국에서도 역시 초기에는 뜨거운 환영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교(夷敎, 서역의 오랑캐교)라 하여 금지령을 당하며 왔던 길을 돌이켜야 하는 고난도 있었다.
당대 이전의 동방기독교(5~7C)/ (Eastern Christianity before the Tang Dynasty, 5~7C)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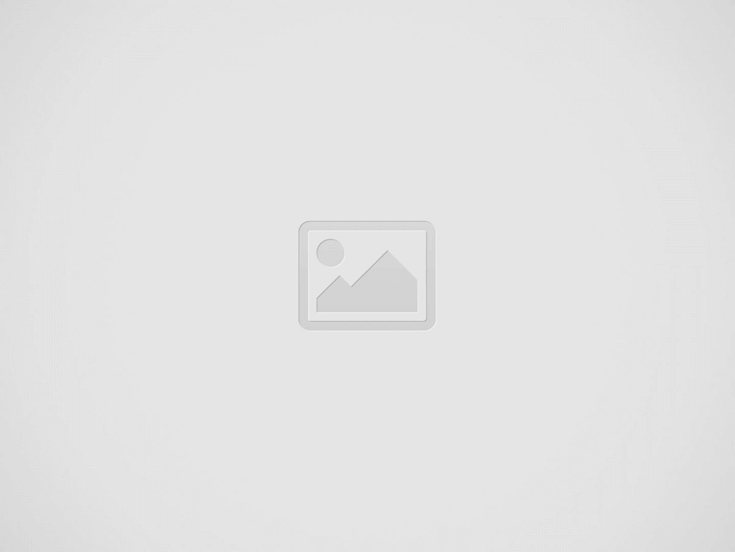

이슬람의 태동과 페르시아의 상황 (The Rise of Islam and the Situation of Persia)
7세기 초에 시작된 아라비아(大食國)의 태동은 점차 거세게 역량을 발휘하더니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받들어 이슬람교가 창립되고, 아라비아의 모든 국가들이 이슬람교를 공동 신앙으로 삼았다. 632년 무함마드가 서거한 후, 아라비아 칼리프의 정교일치 정권이 탄생했는데, 그는 아라비아반도의 모든 나라를 통일한 후, 거침없이 동로마제국과 페르시아를 점령해 곳곳에 이슬람화에 성공한 사람이다.
내우외환의 페르시아 사산왕조는 밀려드는 칼리프 군대를 막아낼 방도가 없었고, 결국 페르시아 왕 야즈데게르드 3세(Yazdagird III)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다. 이에 겨우 살아남은 사산 왕조의 남은 병사들은 이슬람 세력을 피해 세력을 모아 페르시아 동부의 고원 토화라(Tokhara)로 도주해서 무려 백 년간이나 숨어 지냈다.
용삭 원년 661년에 야즈데게르드 3세의 아들 비루스(Pirooz)가 당에 친서를 보내 구원병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고종은 길이 멀다는 이유로, 출병은 거절하였을 뿐, 당은 오히려 서역에서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루스를 페르시아 왕으로 책립(662)했다. 그 후에도 비루스는 두 차례 더 조정을 찾았으나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과거 페르시아의 찬란했던 제국과 비루스의 간절한 고토회복의 꿈은 이렇게 이 타국 땅에서 종지부를 다하게 된다.
아라비아 이슬람에 의한 페르시아 멸망 소식을 접한 당시의 많은 페르시아인들은 이슬람의 핍박과 공격을 피해 서둘러 험산준령을 넘고 실크로드를 통해 당으로 밀려 들어왔다. 때마침 당의 이민족 개방정책으로 이들은 어렵지 않게 정착할 수 있었고, 그들은 특유의 뛰어난 비지니스를 발휘해 현지에 쉽게 적응하게 되었다.
그들은 주로 실크로드의 각 경유지인 도시에 정착하였는데, 육로 실크로드를 통해 주로 수도인 장안과 낙양, 양주 등지까지 자리를 잡았다. 이들 중에는 다수의 경교도들이 있어서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문화와 종교적인 색채로 현지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한 점도 다른 측면의 유입이라고 볼 수 있다.
2) 실크로드의 상황(Situation on the Silk Road)
A.D. 457년에서 486년까지 동방교회가 사산제국에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껄끄러웠던 로마제국으로부터 공적으로 추방된 사실만으로도 사산제국에 이들이 정치적으로 무해하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셈이었다.
더욱이 이라크의 사산령의 주민들이 시리아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동방교회는 이 중요한 복음전파의 기회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공교롭게도, A.D.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선고받은 단성론자들도 시리아어를 사용하므로 동방교회에 이어 사산제국으로 어렵지 않게 이주하였다.
중국 전국시대(B.C. 403~221) 서역에서는 페르시아제국(Persian Empire)의 패망에 이어, 서부아시아에는 시리아왕국(Syrian Kingdom)이 섰고, 파르티아왕국(Parthians Kingdom) 과 중앙아시아 박트리아왕국(Bactria Kingdom)이 각각 독립되어 번성해 가고 있었다.
북아시아에서는 흉노(B.C. 280)의 세력이 날로 팽창해가고 있을 때, 유방(劉邦)이 전한(B.C. 202~A.D. 8)을 건국하였고, 서역의 중앙아시아와 서부아시아 등 여러 나라와 우호관계를 가지면서 로마제국과 점차 접촉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무렵부터였다. 한무제(漢武帝)의 서역진출을 시작으로 이서지역의 일부 나라와 수교를 맺기도 했으며, B.C. 135년에 장건(張騫)을 사절로 임명해 서역으로 파송하여, 흉노와 자주 교전 상태에 들어갔다.
6세기 말, 수(隨)나라는 티벳(吐蕃)까지 진출하여 영토를 확장했으며, 교역 및 전쟁으로 서북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도 접촉하였다. 또 후한(後漢)의 반초(班超)가 A.D. 83년에 서역의 여러 나라를 침공하며 파르티아왕국과 수교를 맺음으로 흉노의 세력이 약화의 기로에 접어들었다.
A.D. 97년에는 그의 부하 감영(甘英)을 로마로 파송했다는 기록이 사기(Records of the China Grand Historian)에 나온다. 이를 통해 일찍이 전한(前漢)이 로마제국과 교류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3) 실크로드의 동방기독교(Eastern Christianity on the Silk Road)
488년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 카바드(Kavadh I)왕이 흉노족과 투르크족, 박트리아에 두 번이나 가서 피난할 때, 그곳 왕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를 후대하여 준 보답으로 귀국하자 자국 내의 전 기독교인을 선대하였다고 전해진다.
555년 단성론자 야곱파(Ya‘qūb) 수도사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동방교회의 감독과 다른 4명의 신부들이 흉노국에 가서 동로마 즉, 비잔틴 죄수들과 흉노인들 사이에서 목회를 하였다고 한다. 그 후 아르메니아 교회의 감독도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채소와 옥수수 파종법을 전해 주었고, 또 이들이 흉노족의 타타르어를 시리아 문자로 표기하는 법을 일러주었다. 소그드어와 위구르어의 문자와 함께 흉노족의 문자들이 흉노의 표기문자와 관련이 있다는 설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중국과 접해있던 북부아시아의 흉노족, 터키족인 돌궐(突厥)족들이 모두 중국의 당조 이전에 기독교를 수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확인되었다. 터키족은 5세기에 흉노족의 영토에서 일어난 부족이며, 중국의 양(梁)나라 영토에서 살았던 족속이었는데 북위(北魏)가 후에 그 지역을 통치한 것이다. 500가족으로 형성된 ‘투구’라는 뜻의 부족이 중국 국경과 인접하면서 그들이 생산한 말과 중국의 비단을 교환하였다.
5세기 초, 동방교회는 페르시아에서부터 교회조직과 선교적 행정을 갖추며, 크게 부흥하여 복음의 행보 역시 더욱 바빠지기 시작했다.
동방기독교는 아랍인들의 발길에 앞서 동쪽의 시스탄(Sistan), 대하(大夏), 아리(Arie)와 마르지아나(Margiána)까지 복음을 전달했다. 498년에는 에프탈(Ephtal)인들이 그들을 받아들였고, 후일 그곳에 대주교구를 세웠다(549년).
6세기 말엽에는 중앙아시아를 건너 돌궐(突厥)과 키르기스(Kyrgyz, 康居) 등지까지 진출하였다. 당시 동방기독교의 중심도시는 메르브(Merv, 木鹿)로, 일찍이 주교구가 설치된 곳이기도 했다. 소그드인이 집단 주거하는 키르기즈와 유목지대가 동방기독교의 주요 전도대상 지역이기도 했다. 당시 돌궐인들은 복음에 대해 다른 지역인들보다 훨씬 관대하게 받아들였다.
560년경, 그들 중에는 이미 기독교를 신봉하는 자들이 셀 수없이 많아졌는데, 소문에 의하면, 당시 바흐람 추빈(bahram chobin)을 위해 고용된 용병들보다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았다.
또한, 591년경에는 동로마의 황제가 페르시아를 도와 붙 잡아 온 돌궐의 포로들에게 이마의 십자가 유래에 대해 묻자, 포로들이 대답하기를, 군인들이 전장에 출전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이마에 십자가 문양 을 그려 넣는 전통이 있었고, 또 다른 근거에 의하면 당 시 소그드와 돌궐지역에 전염병인 온역이 심하여 기독교인들 사이에 무사안전과 평안을 기리는 유행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618년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건설될 때 수의 속령처럼 되어있던 東터키국이 唐의 정복을 받고 630년에 그들은 흩어져 버렸다. 唐을 세운 당공(唐公) 이연(李淵)의 모친은 터키의 투르크 가문의 여자였는데, 그녀가 기독교인(동방기독교계)이었다는 사실을 추정해 볼 때, 그녀의 손자인 당태종이 동방기독교의 선교사들을 환영하고 도와준 연유를 짐작할 수도 있겠다.
당태종은 西터키국과 친선관계를 도모하였고, 당시 西돌궐국 왕이 당조에 통혼(通婚)을 청하여 허락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동방기독교도가 많았던 돌궐국과 唐나라의 교류는 시리아에서 동방기독교의 선교가 시작된 633년 이전에도 중국에 기독교가 소개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다.
중국 漢代에 인도의 불교가 들어온 것(B.C. 2)도 북아시아의 흉노, 터키를 통한 것 즉, 인도의 종교가 북쪽으로 접경한 중앙 및 북아시아 지역으로 먼저 들어갔던 것이다.
624년 메르브(Merv)의 주교 엘리에(Elie)의 말에 의하면, 한 명의 돌궐족 수장으로 인해 부족 전체가 기독교로 귀화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781년 동방기독교 대주교인 디모데 1세(Timothy Ⅰ,)가 일찍이 수도원의 마롱 수도사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에는 “당시 돌궐의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들이 조상으로 섬기던 우상숭배들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다. 또한 돌궐의 왕이 자신의 국가에 주교를 세워 달라고 청해서 이에 즉각 승낙했다”는 내용의 편지글이 발견되었다. 이는 당시 디모데 1세가 8세기 기독교가 중국에 전파되게 한 기폭제의 역할이 되어줬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7세기 폭풍처럼 번져오는 이슬람 세력의 팽창과 정복으로 인해 그동안 칼리프의 협조적인 태도는 압제로 급변하여 동방기독교에 적지 않은 피해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각지의 기독교의 예배당이 훼파되고 재산이 몰수되며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을 당하는 등 큰 핍박이 오기 시작했다.
또 다른 측면의 위기는, 이들 이슬람은 코란에 근거하여 기독교와 기타 이교에 포교금지령이 내렸고, 또한, 이들과의 무역을 둘러싼 분쟁과 충돌이 일어났으며, 내부적으로는 가톨릭과 동방기독교 간의 다툼과 내부의 부패까지 이어져 일반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일까지 생겼다.
7~8세기 초하(楚河) 지역에는 예배당이 수복되었는데, 이 예배당은 14세기까지도 사회봉사 단체로서 대단한 활약을 펼쳤다고 한다. 이들은 대다수가 카를룩(Qarluq)인으로 역시 기독교인들이다. 8세기 말 돌궐인 지역선교를 위해 큰 규모의 교구가 세워졌고, 비슷한 시기에 나하번드(Nahavend) 지역에도 대교구가 세워졌는데, 이 지명은 아직까지도 고고학적 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시리아의 작가 에베드 예수(Ebed lesu Sobensis)는 동양의 기독교 고대사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셀루키아의 대감독 아케우스(Acheaus)와 실라스(Silas)가 코라산(Khorasan)에 있는 헤리아(Heria)와 사마르칸트와 중국에 교구를 세웠다고 말하지만, 실은 로마가톨릭 감독 살리바 자카(Saliba-Zacha)가 세웠다는 반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살리바 자카 감독은 714-728년 사이의 감독이었고, 아케우스와 실라스는 각각 5세기 초와 6세기 초의 감독이었다. 감독과 교구를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이미 선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진행된 교회들이 있어야만 된다. 즉 살리바 자카 감독의 직무기간의 시작인 714년 이전에 중국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동양 교회사의 저자 아세마니(Assemani)가 만든 셀루키아 교구의 관할 안에 들어있던 교구들의 목록에서는 중국 교구가 인도 교구와 함께 인정되고 있다.
에베드 예수가 일러둔 바에 의하면 교구의 순위는 그것을 세운 총 대주교나 대감독들이 살아있던 시기를 표준으로 한 것이라는 것으로 중국 교구와 인도 교구의 설립 시기가 같다는 말이 된다. 초기 시리아 교회와 인도 교회에서 나온 기도문과 전설 같은 이야기들은 사도 도마가 중국에까지 선교하고 다시 인도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17세기 청조 때에 중국 선교사로 온 예수회 수도사 티리고(Trigault)는 이 사실을 말라바 교회가 가진 시리아어 문서들에서 인용하였다. 버키드(F.C Burkitt)도 같은 내용을 지적하였으니 사도 도마는 인도에서 우상숭배의 잘못을 지적하고 중국인과 에디오피아인에게 진리를 알렸으며, 중국에서 천국소망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다.
16세기에 프란시스 자비에르(France Xavier)는 인도의 남단 고아(Goa) 지방에서 사도 도마 중국 선교기를 들었는데, 많은 중국인 개종자들이 있었고, 헬라 교회 감독들을 중국에 보내서 도마와 제자들이 전도한 신자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인도로 돌아왔다고 1546년 5월 10일 편지에 기록했다.
1556년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간 도미니쿠스 선교사 크루스(Gaspar da Cruz)가 쓴 편지에는, 그가 사도 도마의 순교지로 알려진 인도를 순례했을 때, 그곳을 순례 하러온 한 알바니아인 성도의 연구에 의하면, 아르메니아 교회의 문서에도 사도 도마가 중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많은 박해를 받고 인도로 돌아가 순교했다는 것이다. 예수회 선교사들이 16세기 중국에서 유대인들도 만났고, 또 기독교인도 만났다는 보고가 마테오 리치의 기록에도 나타남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그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9세기 唐朝 말기에 박해를 받고 거의 사라져 버린 景敎徒들인 지하 교인들의 후예들로서 장기간 숨어 지내다가 십자가 그리기 의식 정도만을 보존하고 그 밖의 교리를 망각한 신도들일 수도 있고, 혹은 몽골 제국 전성기에 중국으로 들어온 네스토리우스파 교인들의 후예들일 수도 있다고 추측한다.
페르시아의 셀루키아 대교구의 총 대주교들은 8세기 이후 계속 인도 교구와 중국 교구를 관할 교구로 간주하였다. 데오도시우스(Theodosius) 총대 주교도 중국 교구를 언급하기를, 인도 교회의 도마 전통을 중국교회도 공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16세기 포르투갈인들이 인도에 왔을 때 말라바 교회의 감독 야곱(Mar Jacob)은 그가 가진 신약성서 책 맨 뒤쪽에 ‘인도와 중국의 대감독 야곱’ 이라고 서명한 것으로 전한다.
또한, 프랜시스 사비에르가 인도에 와서 사도 도마의 중국선교에 대한 전승을 듣게 되었고, 자기도 중국선교를 계획 하였는데 뜻밖에 일본인 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전도하여 개종시키고는 그를 통해 일본을 소개받고 중국선교를 뒤로 미루고 일본에가서 선교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景敎가 전파된 지 매우 오랜 후 세기의 일임을 알아야 한다. 당시 남인도 해안지역은 서방교회의 극동지역 선교 계획 추진을 위한 적절한 중간 지점이라는 사실이다.
반면, 893년 탈라스(Talas)의 한 기독교 예배당은 아라비아인(大食人)에 의해 모스크로 개조되기도 하였다. 다행히 한 지역에만 예배당이 있는게 아니라, 키르기스(Kyrgyz) 지역 여러 곳에 예배당이 세워졌다고 한다. 부하라(Bukhara)의 가장 오래된 모스크도 실은 기독교 예배당을 개조해서 만든 것으로, 이를 통해 이미 이슬람 세력들의 동진 정황이 곳곳에 파고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95년, 인근의 호라즘 제국(Khwarezm)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로, 그들 가운데는 흑해지역에서 귀화한 일부 발지크(Barjik)인들도 있었으며, 유대인들로 통치계층을 삼았다. 이윽고, 안타깝게도 이슬람 세력들이 그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침투해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이 지역은 카스피해와 흑해유역 각 강 하구의 분지지역으로 아주 오랜 역사가 밀접하게 이뤄진 곳이기에 자연스레 이슬람 세력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비잔틴 사람들은 역으로 이슬람교를 향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로 다량의 선교사들을 파견하였다. 그들 중에는 유명한 선교사가 성 시릴(Saint Cyrille)이 있었다.
7세기 시작과 함께 동방기독교는 중국의 변방인 신장지역까지 입지를 다졌으며, 바로 그곳은 향후 중국 복음전파의 전초기지가 되어줬다. 이로 인해 알로펜(Alopen)의 지도하에 대하인(大夏人)들은 기독교 복음을 지니고 타림분지(Tarim Basin)를 출발하여 635년 드디어, 장안에 도착하였다.
동방기독교의 행보에는 늘 순풍만 불어준 게 아니었다. 비록 그들이 초기에는 페르시아에서 관용적 대우를 받았지만, 후일 엄청난 박해와 순교도 감당해야 했다. 중국에서도 역시 초기에는 뜨거운 환영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교(夷敎, 서역의 오랑캐교)라 하여 금지령을 당하며 왔던 길을 돌이켜야 하는 고난도 있었다. 물론, 절망 중에 잠시 놀랄만한 부흥의 시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세기에 들어 사실상 동방기독교는 중원에서 거의 소멸하다시피 했다. 특히 중앙아시아에서도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0세기의 무슬림 사료에 의하면, 신장에서 동방기독교인들의 열정적인 선교로 인해 현지 일부의 돌궐족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한다. 그들의 개종의 범위와 과정은 웅그트족(Ongghud)과 카라 키탄(Kara-Khitan), 그리고 칭기즈칸 전승 이전의 몽골 조상인 거란인(契丹人), 마지막으로 몽골 칸(Khan)의 가정에서부터 동방기독교인으로 개종이 이뤄졌음의 종적이 발견되었다.
프란시스코 탁발수도사 루브루크(F.W.Rubruck)가 말하기를 몽골인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항상 동방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중국 중원까지였다. 한인들은 몽골 기독교인들을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온 자들이라고 여겼고, 이들은 주로 거란(契丹) 등 15개 도시에 거주하였는데, 이때 西京(西安)에는 대주교부가 설립되었다.
975년 동쪽의 기독교 생활지인 카슈가르(Kashgar, 疏勒), 호탄(Khotan, 于闐), 야르칸드(Yarkand, 葉爾姜) 그리고 투루판의 서부에는 한 대주교를 임명해 세웠다.
또한, 마르 야벨라하 Ⅲ세(Mar Yaballaha Ⅲ)는 동일시기에 발전한 서하(西夏) 동방기독교들의 열정에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11세기에 들어 이슬람의 거침없는 확장으로 인해 호라즘(Khwarezm)왕국이 “이슬람교의 관문”으로 바뀌었지만, 동방기독교는 여전히 부흥 중에 있었다.
8~13세기 회홀인(回鶻人) 통치 시기에는, 감숙(甘肅)의 녹주(綠洲)와 신장의 녹주(綠洲)에는 기독교가 크게 부흥했는데, 회홀인들 중 기독교인들의 비중을 헤아리기는 결코 쉽지 않을 정도였다. 이에 13세기 아피(Awfi)는 말하기를 “당시 회홀인들이 기독교를 의심 없이 무작정 신봉하지만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하여 바톨드(V. V. Bartold)도 이 학설에 동감한 반면에, 프렌 카핀(Jean de Plan Carpin)은 더욱 신중하게 말하기를, 회홀인 기독교인들이 당시 통치 지위마저 가졌었다고 했다. 13세기 말 카슈가르(Kashgar, 疏勒)와 하미(Hami, 哈密)에도 주교구가 설립되었다.
투루판의 동방기독교의 중심은 녹주(綠洲) 동부의 부야리크(Buyalik)였다. 그곳에서 대량의 古시리아문과 소그드어, 돌궐어문을 사용한 기독교 문헌의 잔해들이 발견되었다. 기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문헌으로는 “복음서, 모세오경, 전도서, 聖조오지행전” 등으로, 거의가 다 시리아 원문에 가까운 석판 역본이다. 이는 古시리아문이 실크로드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졌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오늘날 세계 공용어로 쓰이는 영어와 견줄 정도로, 古시리아문은 실크로드에서만큼은 공용어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감숙(甘肅)에는 적어도 세 군데에 큰 예배당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당시 신장지역보다 많았다. 카디즈(Cardizi)는 호탄에 교회당이 한군데 있다는 것과 동시에 그곳의 한 무슬림 무덤군의 위치를 찾아 알리기도 했다. 이는 일찍이 기독교 지역이 무슬림 세력에게 점령 당했음을 시사해주는 바이다. ◙
저자 김 규 동 Ph.D.
Silk Road 고대기독교 연구소 소장, Silk Road 고대기독교 유물관 관장, 광신대학교 초빙교수, 中國 사이비&이단 대책 연구소 소장, 고대기독교 역사탐험가, GMS/C&M
◙ Now&Here©ucdigiN(유크digitalNEWS)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