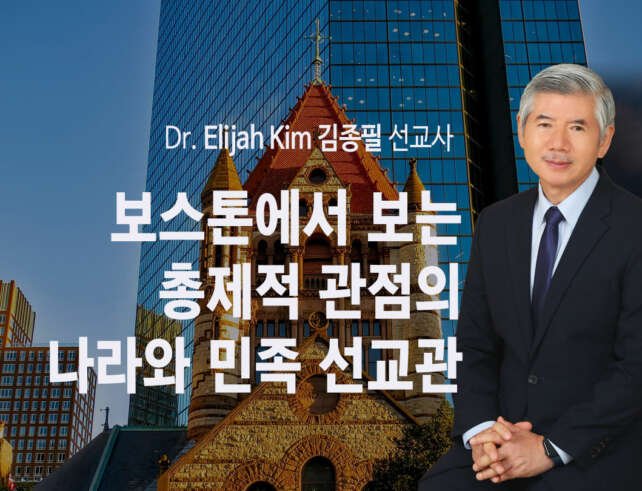당의 종교정책하의 景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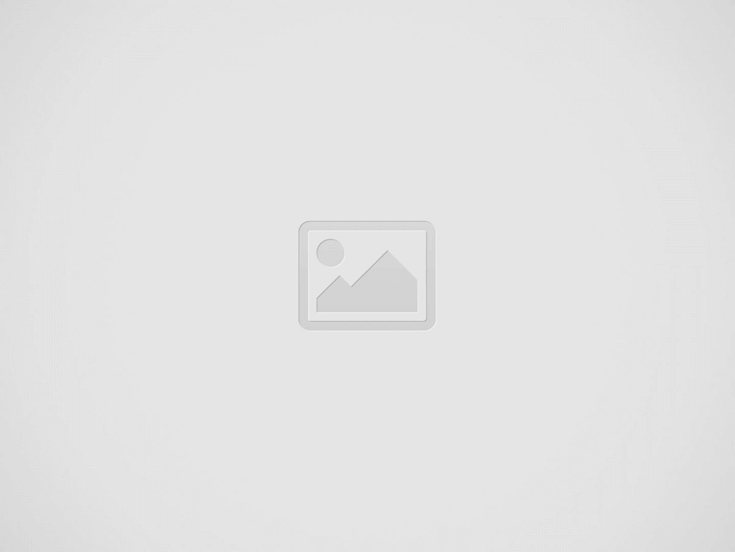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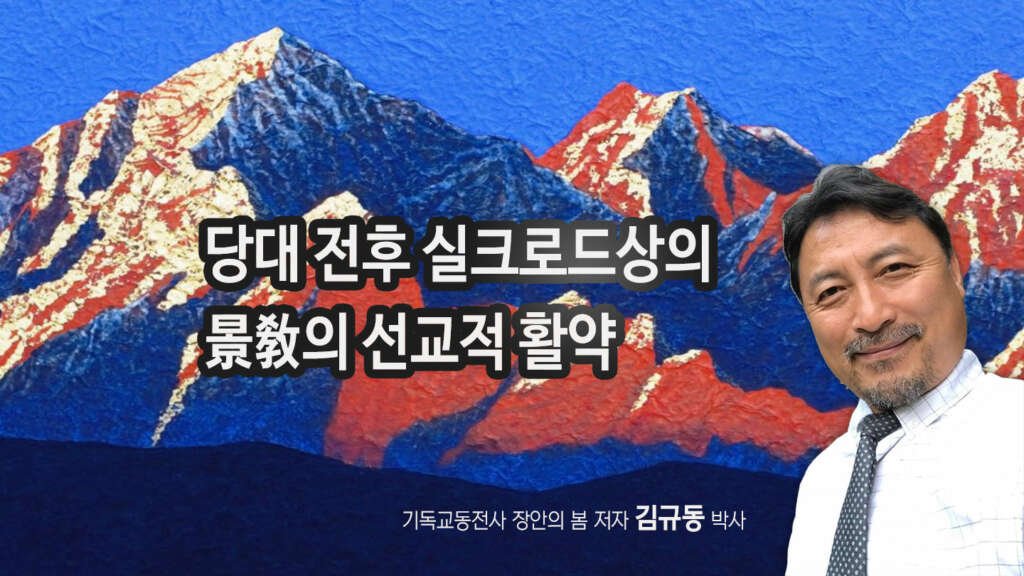
김규동 박사 ◙ Photo&Img©ucdigiN
[역사저널=김규동 박사] 당의 종교정책하의 景敎 <4회> »
5. 景敎의 토착화 시도(The Attempt to Individualize Jing-Jiao)
景敎에 관하여는 당대 역사서인 신·구당서(新·舊唐書)와 당회요(唐會要), 원대 사료인 원사(元史)와 원전장(元典章)을 통해 “法流十道 寺满百城”. 즉, 전국 백여 곳에 20만 이상의 성도가 넘었다고 생생하게 입증하고 있다.
당대에는 유·불·도교가 주류였다. 景敎는 중국에 유입된 이후 적응과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순응했고, 토착화도 염두 하였다.
景敎의 교의에는 도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구 “天尊”은 기독교의 “天父”을 뜻한다. 노자가 말하기를, 周朝 말년에 젊은 소를 타고 서역에 여행 가서 보니 景敎가 당나라가 있는 동쪽으로 건너왔고, 노자 신앙과 함께 성행했다고 한다.
景敎가 전래된 이후 景敎 선교사들은 생존과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도가(道家)의 어휘뿐만 아니라, 당 사회에 보편화와 토착화에 성공한 불교와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기에 불교경전의 관용어와 종교적인 명사를 빌려와 현지인들에게 동방기독교의 토착화를 꾀했다. 이를테면, 景敎의 예배당을 “寺”로 표현했으며 景敎주교를 “僧”이나 “大德”이라 칭하며, 당시 성행하던 불교의 용어를 적극 빌려 사용했다. 景敎의 경전과 서적도 마치 불교의 언어 형태를 빌어 사용했는데 이를테면 “佛”을 “天父”로, 히브리어의 Elohim을 범어의 阿羅訶(A-rhat)로, 景敎徒의 명칭을 “僧”으로 불렀다. 성경의 주요인물에 대해서는 “法王”이라 칭했다.
1908년 스타인(A. Stein)이 서역 탐사 중, 돈황(敦煌)의 천불동(千佛洞)에서 발견한 “序聽迷詩所經”에 보면 唐代 景敎徒들이 예배할 때 자주 “佛”이라는 어구를 사용했고, 마치 “사람이 위급할 때마다 ”佛“이란 단어를 외쳤는데” “높은 보좌에 계신 佛께 간구합니다!” 혹은 “중생에게서 떠나가지 마옵소서!”등이다.
사실 그동안 景敎의 중국선교에 대한 실패에 대해서 많은 평가들이 있었다. 이를 정리해서 보자면, 우선적으로 景敎는 처음부터 자신들의 입지를 잘 다질 필요가 있었다. 景敎가 처음 유입될 시기의 정치, 종교적 환경은 500년 전 즉, A.D. 1세기 즈음에 전래 된 불교와 완전히 다름을 냉철하게 이해했어야 했다.
두 번째는, 불교가 더이상 외래종교가 아닌 이미 토착화에 성공한 중국의 주요 종교로 인정해야 했다. 정치적 고관들부터 하층민까지 불교의 문화는 그들에게 생활의 일부 요소가 되었고, 대중적인 존경과 지지를 받았기에 그들의 영향력은 중국인의 세계관까지 바꾸었다. 반면에, 景敎는 대중적이기 위한 조건들이 불교와 너무나 달랐다. 우선 성직자들이 대체로 페르시아인이고, 언어와 예배의 형태가 토착화와는 전혀 거리가 먼 상태였다. 오히려 일부 상류층만을 위한 특권층 종교로서 알려질 뿐이었음이 景敎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세 번째로는, 불교의 사상체계와 내용은 심오하고 다양했으며, 개방적인 종교로서 수용과 흡수성이 강해 타종교에 대한 관대함까지 있었다.
이상 세 가지 당시 불교의 유리한 상황을 보면서 景敎는 마땅히 중국에서 가져야 할 자세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종교 신앙을 중국에 적용하기 위한 열심히 오히려 토착화에 더 큰 어려움을 주지 않았나 싶다.
그렇다고, 景敎는 전혀 토착화를 염두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름 당대 고서를 통해 보면, 景敎는 토착화를 위해 불교의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나와 있다. 일단 景敎의 성직자들이 초기 중국에 들어오면 “불교도의 신분으로 불경 해석사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貞元新定釋敎目錄》 제17권에 보면, “般若三藏續翻譯經記曰……. 乃與大秦寺波斯僧景淨依胡本. 六波羅蜜經譯成七卷. 時為般若不閑胡語複未解唐言. 景淨不識梵文複未明釋教. 雖稱傳譯未獲半珠. 圖竊虛名匪為福利. 錄表聞奏意望流行. 聖上濬哲文明允恭釋典. 察其所譯理昧詞疏. 且夫釋氏伽藍大秦僧寺. 居止既別行法全乖. 景淨應傳彌屍訶教. 沙門釋子弘闡佛經. 欲使教法區分人無濫涉. 正邪異類涇渭殊流. 若網在綱有條不紊. 天人攸仰四眾知歸. 分命有司乃下制曰.”
여기에 보며 페르시아에서 온 신학자 景淨이 불교의 불경번역 사업에 함께 참여했다는 소개가 나온다.
네 번째로는, 景敎는 불경번역 사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독교적 용어에 불교 술어를 빌어다 썼다. 이는 景敎 역시 대중화를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로는, 景敎는 교리상에서도 불교의 교리를 보편적으로 따라 했다. 景敎의 경전 내용을 보면, 불교의 윤리, 철학, 도덕적인 설법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밖에, 景敎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忠君孝親을 따라 尊君事親의 사상을 끌어내는 경향을 가졌다. 중국의 문화정서에 순응하기 위해, 景敎는 충효사상을 중시했다. 그래서 비문에는 자주 “七時禮贊,大庇存亡”의 문구를 보게 되는데, 이는 “살아 있는 자가 생명 연장을 구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는 명복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역대 제왕들의 공덕을 기리는 문구를 표현했으며, 상층부를 향한 선교를 대대적으로 선포했다. 景敎의 志玄安樂經 중에는 국가의 안정으로 열방이 통치되기를 바란다는 노래 가사가 들어가 있다.
돈황의 막고굴(莫高窟, Mògāo Caves)은 중국 4대 불교석굴로 유명하다. 이 중 에 한 곳 193호 석굴에서 景敎의 역사가 발견됐다는데 지금은 폐쇄되어 내부를 볼 수가 없었다. 다만 박물관에서 막고굴 16~17호에서 발견된 景敎와 관련된 문서는 사진으로나마 볼 수 있다.
6. 景敎의 몇 가지 실패 이유(There are some Reasons Why Jing-Jiao Failed)
1) 내부적 요인(An Internal Factors)
수년 전에 필자가 방문한 서안의 회교(回敎) 모스크는(清真寺)는 景敎에 이어 742년에 만들어진 사원으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중국 어느 도시를 가나 모스크가 시 중심가에 버젓이 서 있는데, 간혹 방문한 모스크 안에는 많은 무슬림들의 진지한 기도 모습에 필자는 다시금 景敎의 몰락에 아쉬움을 가졌다. 이처럼 이슬람이 장시간 명맥을 유지해 온 비결은 무엇이고, 景敎의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본 장을 통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또한, 불교가 일찍이 중국 토착화에 성공한 것과는 달리 景敎가 유입된 시기는 시대적으로 상황이 너무 달랐다는 것이다. 불교는 유입 당시 사후내세론에 관한 체계를 가졌고, 신비하고 토속적인 종교성으로 중국인들의 세계관에 쉽게 다가설 수 있었다. 그러나 약 500년 후, 景敎가 당의 개방 여파로 다양한 종교와 무역업자들과 함께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올 시점에는 현지인들이 더 이상 심오한 종교보다는 활발한 상업에 눈을 뜨기 시작했던 때이다.
말하자면, 중국(唐,元)에서 景敎의 성행과 쇠락은 너무나 짧은 4~5백년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비록 景敎는 일부 왕조의 호의와 지지로 예배당과 비석을 세우는 등 뿌리내릴 것 같았는데, 이처럼 순식간에 중국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고 소멸되다시피 했는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景敎가 민간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가? 라는 질문에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 다만 서역 종교의 하나로서 중국인에게는 호기심을 줄 수 있었고, 의술과 포교에 열의를 가지고 다가섰지만, 결국 민간에 흐르는 세속적 욕구로 景敎는 뿌리내리지 못하였는데, 이는 마치 가시덤불에 씨앗이 뿌려짐으로 인해, 가지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비단 景敎뿐만 아니라 실크로드의 三夷敎는 당대 동시에 철퇴를 맞고 종적을 감추었다. 그중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으로 당의 대외개방정책에 따른 각 종교의 세속화를 들 수 있다.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 보자면 당대 유입 이전 그들만의 신비스러운 종교적 신앙형태가 이미 종교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唐의 토양 아래서 더이상 순수성과 신앙적인 갈급함이 없는 환경 속에서, 景敎는 단지 洋敎로서의 한 종교로 비칠 뿐이었다.
당의 개방정책에 의해 상업화가 되어버린 종교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 액세서리에 불과했다. 당대 각 종교의 예술색채가 강하게 표현된 것은 종교의 상업화를 말하는 것이고, 景敎가 현지화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로, 景敎는 정치와 너무 밀착했다고 본다. 이른바 「趙孟之所貴,趙孟能賤之」이다. 그들의 운명을 통째로 황제의 손아귀에 쥐어줬다는 말이다. 古代 통치자에게 있어서 종교의 존재는 반드시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의 정당성과 합법성은 통치자의 해당 종교가 사회와 정치적인 안정(國泰民安)을 위해서 이로운지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결국, 景敎가 공식화와 합법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정치를 가까이할 수밖에 없는, 즉 자신의 운명을 국가의 통치자에게 맡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대의 정치상황은 더욱 그러했다. 정치, 경제, 종교 신학과 해석 등 모든 논리가 황제의 권한 하에 있었다. 이러한 논리로 당시의 景敎를 평가하자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다만 중요한 건 그들이 궁 밖에서의 현지화와 토착화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당시 중국의 토착신앙인 유.불.도는 이미 민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만 景敎 만큼은 오직 편향적인 모습으로 황실과 관직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뿐이었다.
세 번째로, 景敎는 후일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내던지고 타 종교와의 연합을 꾸미다가 오히려 자신만의 종교적인 색채마저 잃어버렸다. 물론 당시의 유.불.도는 각기 서로 어우러져 보기 좋게 민간에 파고들었다지만 서역의 종교인 景敎가 그들의 흉내를 따라 하다가 부작용만 낳고 만 것이었다.
景敎의 선교사들이 철저히 유가의 사상을 흡수하고, 불교와 도교의 용어를 대거 빌어서 기독교의 경전을 번역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방법은 실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었다. 특히 중국에서 유.불.도교가 서로 어울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더라도 당태종의 조서에서 언급했듯이, 각종 종교들의 어우러짐이 결국에는 무의미하지 않는가? 사무엘 모펫 박사가 말했던 것처럼,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선교적 적응의 범위의 도를 넘어서는 토착성(Compromise and Accommodation Beyond the usually Acceptable Limits of Missionary Adaptation)을 위한 신학적 타협일 뿐이었다.” 이것은 동방기독교 공동체가 자기 고유의 종교적 색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인 것이다.
景敎의 지나친 토착화는 결국 자신만의 특색을 잃어버리는 변질된 형태의 결과물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사대부들로부터 배척당하는 뜻밖의 일도 맞았다.
넷째로, 당의 본토인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인한 당 문화의 우월감은 외세문화에 대한 배척으로 나타났다. 실크로드를 통한 서역의 문명이 당의 전반부에 영향을 주고 있을 때 사대부를 비롯한 관료들이 서서히 불만으로 표출되다가 결국은 외세탄압의 역효과를 불러왔다. 당의 대외 개방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일면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이장식 교수는 “본토인의 문화수준이 향상되고 경제적 발전도 어느 정도 이룩하여 외래종교의 신도들, 곧 외국인의 도움의 필요성이 줄어들 때, 그동안 자기들이 잃었던 자존심과 체면, 긍지를 회복하는 운동을 자기들의 고유종교의 부흥운동과 연결”시키게 되는데, 중국에서 景敎 공동체는 이러한 당대 중국인들의 “고유종교의 부흥운동”에 의해 직접적인 소멸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고 본다. 결국 景敎는 중국 당대의 민족적 자긍심에 희생당했다는 견해이다.
다섯째로, 그간의 景敎는 포교의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외국인에 의한 외래종교로서 대다수 신자는 외국 상인과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국내 중국인들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국내외(외적 요인으로는 중앙아시아의 이슬람화를 들 수 있다)의 상황 변화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景敎의 수장 중에는 중국인이 한 명도 없었다. 이는 현지인에게 주도권이 이양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주교는 물론이고 주교, 주교장 등 교구의 중심 서열의 리더십은 모두가 다 페르시아나 중앙아시아인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불교와는 다르게 외국종교라는 인식을 깊게 심어줬고, 단지 경전 번역을 통한 문서사역에만 치중했을 뿐이었다.
이에, 오늘날의 선교사들을 통해 당시의 景敎를 이해해 본다. 주도권 이양은 선교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섯 번째로, 동방기독교의 감독과 주교들은 결혼이 불허되었기에 거의 독신 혹은 개인적으로 선교를 진행했을 뿐, 다른 종교처럼 가족 단위로 구성하지 못했다. 이 역시 현지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점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일곱 번째로, 대주교와의 연락체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 또한 큰 원인으로 꼽는다. 이유는 중앙과 거리상으로 갈수록 멀어져 갔기에, 결국 고립을 자초했다.
마지막으로, 불교의 토착화의 성공요인 중 하나는 다수의 신자들이 직접 인도에서 불경을 체득하고 돌아와 불경 번역을 통한 토착화에 속도를 낸 데 있다. 그러나 실크로드의 三夷敎는 번역작업에 소홀했다.
2) 외부적 요인(An External Factors)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사라센(Saracens)제국의 확장(650), 무주혁명(690)과 회창법란(845), 황소의 난(875~884) 등을 들 수 있다. 연이은 반란으로 景敎는 9세기 말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에 김호동 교수는 “인도양을 통해서 중국의 해안도시를 찾아오는 상인들 가운데 네스토리안 교도는 거의없고 대부분이 이슬람교도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즉, 景敎徒들은 현실상황에 대한 넓은 안목을 갖질 못했다. 다만 주어진 사역에만 몰두했기에 미래에 닥칠 운명을 점치질 못했다. 말하자면, 아랍의 팽창을 가볍게 여겼다.
또한, 압바스 왕조가 750년 바그다드로 수도를 옮긴 후 중앙아시아와 해양 실크로드의 주도권이 이슬람으로 넘어가면서, 중국을 찾는 외국인들 중 네스토리안교도들의 유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이를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펼치던 기존의 네스토리안 교세는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9세기 말의 대규모의 박해로 인해 그들은 중앙아시아의 초원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해상 실크로드의 차단으로 외부의 지원과 인력보충이 전무한 상태에서 결국은 약소 종교로 탈바꿈하는 상황까지 이른 것이다.
둘째로, 이단문제로 인해 고대 시리아어만의 사용을 고집하게 된다. 이는 자신들의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유익했지만 토착화에 큰 장애가 아닐 수 없다.
셋째로, 전도의 대상인 하층민에게 깊이 파고들지 못한 까닭은 대부분의 하층민들이 문맹자들로 문자를 몰랐고, 또한, 문자 해석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초기 동방기독교 선교사들은 사대부에게만 다가설 수밖에 없었고, 이에 景淨의 번역사업은 속도를 내어야만 했다.
마지막으로, 景敎는 비단 당대에서만 실패한 게 아니었다. 기독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 즉 일명 “바티칸의 방해(A Vatican Intervention)”라고 저자는 말해두고 싶다. 이 방면에 관하여는 따로 시간을 내어 논고를 통해 증명하려 한다. 네스토리우스의 이단 파문에서 비롯된 로마교회(Roman Catholic)의 무서운 음모와 추격전이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전체적인 동방기독교의 역사적 운명을 이해하게 된다.
동방기독교의 개척과 로마교회의 방해는 기독교사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3) 결과
당 말기, 의기소침한 흩어진 景敎徒들의 행렬은 주로 중앙아시아나 몽골 땅으로 돌이켜야만 했다. 고서에 의하면 당시 실크로드 변방으로 밀려난 景敎徒들은 방향을 잃은 병사들처럼 우매하기 그지없었다. 당시 거란(契丹)의 다수의 景敎 성직자들에 대한 소문에 의하면 “모든 일에 관하여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다!”고 했다. 그들은 마치 라틴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수도사들이 라틴어로 찬양함과 같았다. 이를테면 그들은 고대 시리아어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부패하고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며, 일부는 고리대금업자들이거나 고주망태로 전락하였다. 한 가지 더 보충하자면 일부 景敎 성직자들은 중혼한 자들이었고, 추잡한 성직자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성직을 행하면서 돈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결코 성직을 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주 악랄하고 파렴치하며 몰인정한 생활을 보냈다. 전체적으로 성직자들의 삶은 더욱 경건하게 임해야 하는데 당시 일부 景敎 성직자들의 안일한 생활로 인해 景敎는 지탄을 받기도 했다.
◙ Now&Here©ucdigiN(유크digitalNEWS)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