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부 도둑의 앎과 삶 이야기

Share This Article
처음 부분의 표면과 끝 부분의 이면이 연결된 공부의 고리
학문은 말하자면 일생을 두고 오르는 등산길이다. 빨리 올라가 멋진 조망을 보고 남이 오르지 못한 새 봉우리에 첫발을 디뎠다는 영예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겠는가? 그러나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길게 보면 이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소진시켜 더는 진전을 어렵게 하고, 성급한 나머지 발을 잘못 디뎌 다칠 위험을 가증시킨다. 오직 자기 몸과 학문의 세계를 하나로 조화시켜 그 안에서 지속적인 즐거움을 찾아 나가는 길만이 장기적인 성취를 가능케 하며, 설혹 특별한 성취가 없더라도 그 삶 자체로 값지다. – [ 책 내용 중에서]
[북스저널=정이신 목사] 한 공부 도둑의 앎과 삶 이야기 » 장회익 지음 | 출판사: 현암사 » 저자가 걸어왔던 길에 존경을 표합니다. 학교를 못 다니게 했던 할아버지의 엄명을 넘어서서, 유학을 다녀와 교수가 되기까지 그가 걸었던 길이 잔잔하게 물결을 일으키며 마음을 적십니다.
저자의 말처럼 굳이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경쟁 상대로 설정해 놓고, 미친 듯이 그 사람보다 앞서보려고 내달리는 소진증후군(消盡症候群ㆍBurnout syndrome)에 걸린 환자가 제 주변에는 꽤 있습니다.
자기의 길이니 자기의 속도로 가면 되는데, 굳이 자기의 길을 자신의 속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속도로 내달리려고 하니 늘 문제가 생깁니다. 저자는 생물학자가 아닌 생(물)물리학자에 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환원론으로 생명을 해석하는 생물학과 생기론으로 해석하는 물리학의 차이도 말했는데, 이런 건 물리학과 생물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리학이 죽은 걸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기에, 생명의 신비를 강하게 느끼는 사람은 생물학자가 아니라 오히려 물리학자라는 언급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책을 읽을 때 완독(完讀)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 ‘어떤 구절이 나에게 의문을 던지는가’를 묻고, 나를 도끼와 망치로 깨우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독서법(讀書法)으로 봤을 때, 이 책의 묘미는 철저하게 끝 부분에 있습니다. 아홉 째∼ 열 두 째 마당에 저자가 말하려는 게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열째 마당(온생명과 낱생명)은 이 바라본 생명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보면 저자가 물리학자인지 철학자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저자의 친절한 배려 덕에 열한째 마당(가르침과 깨달음)으로 들어서면 ‘그럼, 그렇지!’라는 탄식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물리학자다운 풍모가 천연덕스럽게 드러난 곳이 열한째 마당입니다. 그런데 행여 ‘수포자(수학 포기자)’라는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은 열한째 마당에서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스승의 손가락만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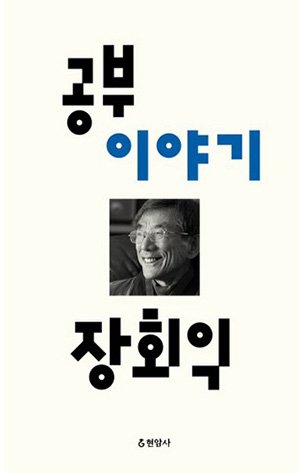
저자의 말처럼 우리가 어떤 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걸 담을 수 있는 사고의 틀을 먼저 내 안에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의 틀은 교사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스스로 깨달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스승의 손가락만 보면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열한째 마당에서 다룬 시공간(時空間)은 3차원(x,y,z)에 이어 ‘t’라는 변수로 표현된 4차원을 설명하는 수학적 언어의 틀입니다. 물리학자가 이런 식으로 4차원을 표현한 이유는 이를 3차원의 언어로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자는 자기가 지닌 이해가 덤으로 주는 4차원의 구속과 애착의 한계를 수학적 도식을 통해 벗어나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4차원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이런 표현 방식을 채택하곤 합니다. 은 사람이 가장 젊었을 때는 수학에서 시작해 이론물리학을 배우고, 나이를 먹어가며 생물학과 철학을 거쳐 인문학을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해석하는 법은 많습니다. 그러니 수학으로 표현된 물리학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필요한 좌절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책을 읽다가 잘 모르겠으면 의 충고처럼 그냥 건너뛰면 됩니다. 그의 말을 빌리면, 그래도 내가 딛고 일어서서 멀리 볼 수 있는 ‘자기 어깨’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처음 부분의 표면과 끝 부분의 이면이 연결된 공부의 고리는 수학이 아니어도 다른 방법을 통해 여러분을 오직 한 몸인 자연(自然: 스스로 그러함)의 세계로 이끌 것입니다.
글 정이신 목사/ 본지 칼럼니스트/ 아나돗공동체 위임목사
◙ Now&Here©ucdigiN(유크digitalNEWS)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 북스저널 전문칼럼니스트
본지 북스저널 전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