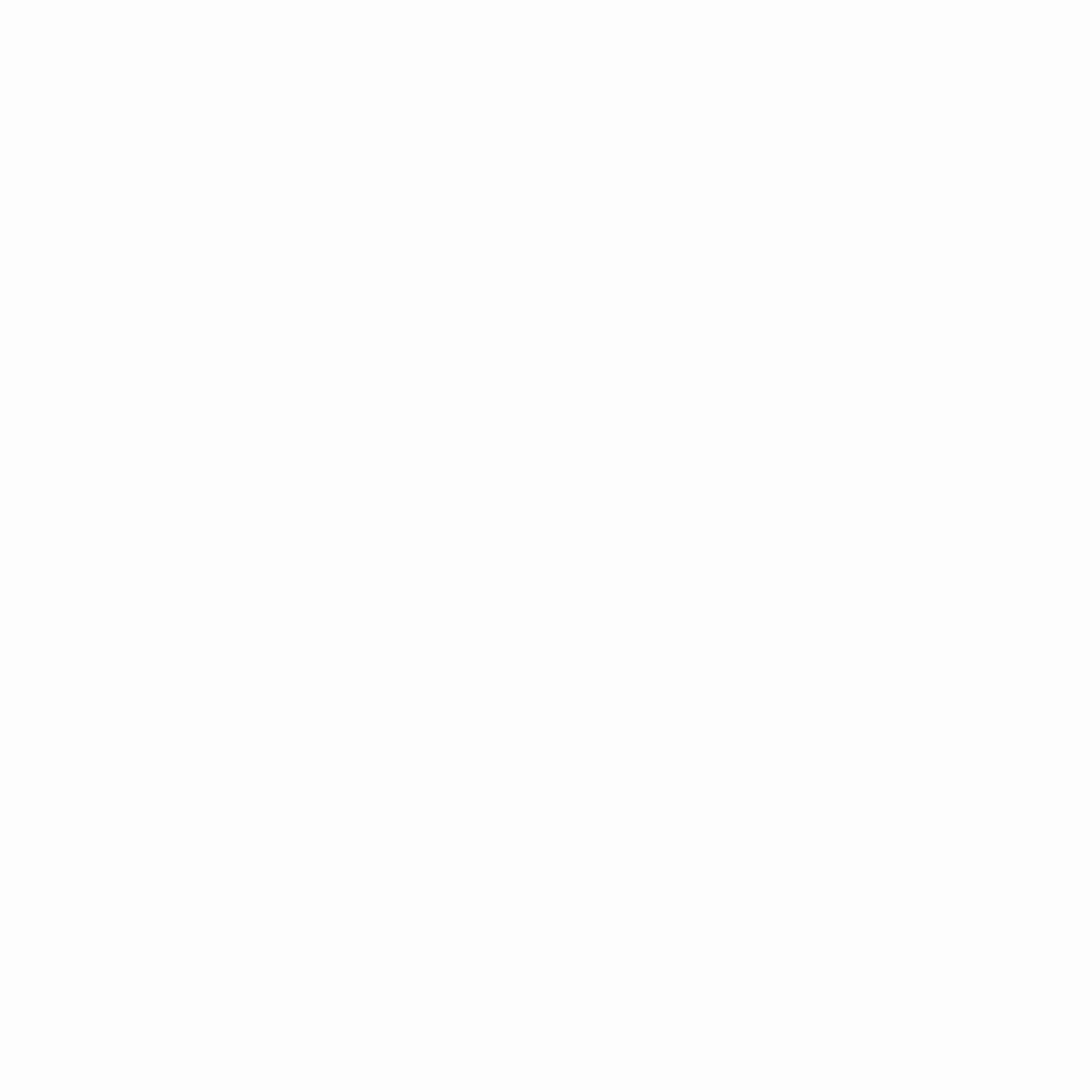[기도/묵상] 나무들 »
조이스 킬머(Alfred Joyce Kilmer, 1886-1918)
나무들
나무보다 아름다운 시를
나는 결코 알지 못할 것 같다.
대지의 달콤한 가슴에
허기진 입술을 대고 있는 나무
하루 종일 산을 우러러보며
잎이 무성한 팔을 들어 기도하는 나무
여름에는 머리 위에
개똥지빠귀의 둥지를 이고 있는 나무
가슴에는 눈이 내려앉고
또 비와 함께 다정히 살아가는 나무
시는 나 같은 바보가 짓지만
나무를 만드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나무를 노래하는 시인들
나무는 시인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왔다. 이성선 시인은 “나무는 시인이다”라고 노래하기도 했다. 그는 나무에게 기대고 싶은 때가 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우리가 나무 가까이 있으면 나무는 두 팔 벌려 말없이 껴안아 준다고 말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나무가 있다. 수백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 자리를 지키는 나무들도 있다. 시인이 아니더라도 나무를 주목해 보는 사람이라면 나무가 제 안에 깊숙이 간직하는 나이를 느낄지도 모른다.
나무 중에도 과목은 과즙을 익히면서 한평생을 보낸다. 그렇게 과목은 열매를 통해 소리 없는 기다림과 생명과, 그리고 헌신을 가르쳐준다.
이 시를 쓴 미국 시인 조이스 킬머(Alfred Joyce Kilmer, 1886-1918)는 1914년에 시집 <나무와 그 외 시들>을 발표하고 1차 세계대전에 터지자 군에 입대, 프랑스에서 작전 수행 중 전사했다. 이 시 한 편으로 세상에 알려진 그는 전후 세대의 미국인들에게 순수의 이미지로 오래도록 기억되었다. 시인은 말한다. “시는 나 같은 바보가 짓지만 / 나무를 만드는 건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언어학자에 의하면 ‘신뢰’를 뜻하는 ‘trust’가 ‘tree’에 어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여러 해 전에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만져본 적이 있다. 관념의 나무와 현실의 나무는 달랐다. 가로수는 견고하고 굳센 군사였다. 거친 껍질과 단단한 속살 안에 숨겨진 깊이와 튼튼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무를 보며 시인들은 다양한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것은 신뢰와 진실의 이미지, 생명과 공존의 이미지다. 그래서 시인은 “하루 종일 산을 우러러보며 / 잎이 무성한 팔을 들어 기도하는 나무”를 보며 옷깃을 여민다. “여름에는 머리 위에 / 개똥지빠귀의 둥지를 이고 있는 나무”, “가슴에는 눈이 내려앉고 / 또 비와 함께 다정히 살아가는 나무”를 바라보며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운다. ◙ Now&Here©유크digitalNEWS
글 송광택 목사/ INUC 독서전문 칼럼니스트/ 010-6334-0306/ songrex@daum.net